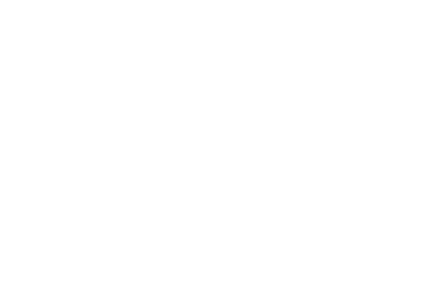To begin, I know you’re fond of inanimate objects. Things like mannequins and robots, but also a camel plushie, a figurine of a little girl on a motorcycle, a Pinocchio doll with a broken nose. You’ve said that taking care of objects—wiping down the camel’s eyes, finding a wall for Pinocchio to lean on—gives you time to think differently about what life is as well. I’m curious what inanimate objects you’ve recently been spending time with and taking care of, and what thoughts you’re thinking through them.
I want to start by saying I’m excited about this conversation. I know I’ll enjoy it. I’ve always felt we shared a certain inner closeness. I’m curious to find out what we’ll talk about, in this place where the personal and literary intersect. I imagine your questions will feel like gifts, each one a mirror that shows me some angle of myself I can’t see. Perhaps among those faces I don’t know I’ll find one I’ve been wanting to visit. The past few years I’ve had a lot of questions, both personal and poetic, which often make me stop and pause, so this conversation feels all the more valuable.
I do like inanimate objects. The moments I spend with them are bright and refreshing. My body and spirit grow quiet and clear. I still spend my time with those few objects you mentioned, each looking after one another. And I’m still captivated by objects, but I don’t keep as many by my side. Maybe you could say I’ve become more careful. Something else I’m keeping nearby these days is a bird. It’s made of linen in grayscale. It has no eyes or beak or wings—or no, maybe it’s hiding its eyes and beak, legs and wings. It has no concrete shape, which makes it seem even more like a bird to me. Even in the dark, it’s a bird. In the light, it’s a bird. With the bare minimum, there’s no need for more. This linen bird helps calm me.
I think your fascination with inanimate objects can be seen in your poetry as well. It’s not just how your poetic imagination manifests in your first collection, When They Ruled the Earth, through mannequins, plastic bags, rice cookers, plugs, and PCs—and later through motorcycles, TVs, sneakers, toilets, and so on—but also in the way you toss up new forms of sensation and thought. I was always surprised by how things that weren’t typically treated as ‘poetic’ objects could become such natural poetry. In your second collection, A Thousand Moons Rising Over the River of Yahoo!, the speaker no longer only writes about inanimate objects, but also speaks as them, finding a cyborg voice. In the voice of the cyborg, there are glimpses of an existential inevitability—it couldn’t not speak. In your opinion, what makes something ‘poetic,’ and what are some poetic objects you’ve been thinking about recently?
I once wrote, “If we love what we can never know, will it become beauty?” I think poetry is active in and of itself. It’s not so much through my own efforts as through the efforts of this unknowable domain called poetry. When I find myself participating together in this unknowable sensation, that feels poetic. I’m partial to that unknowingness. When I write a sentence I wasn’t expecting, within that sentence I can feel a connection to this world, something like the reason I was put in this world. That moment of mystery is probably why I keep writing poetry.
In other words, it’s not so much that I find any particular object poetic as that I let my captivation lead me. In the past I placed more focus on the object I was concentrated on, but I’ve found myself moving gradually toward scenes rather than objects. Scenes from everyday life that you might commonly pass by without noticing. I found a desire to reveal, in a minimal way, the coincidence and inevitability within such scenes. If I’ve had any persistent direction, it’s been an interest in people and the things surrounding them. Especially at points when change is noticeable. I like the collision of disparate things existing together, something you might call contradiction. I think I want to reveal how contradiction is not a boundary, but a form of coexistence. Of course, when it comes to coexistence, I want to maintain a geometrical attitude, like the camera eye, rather than the psychological perspective.
Tell me about roots. There are many moments in your poetry where you mention roots. The roots that appear as a motif in your first and second collections seem to continue later in images of the ankle and foot. I’m curious how you started writing about roots, and whether the thoughts and sensations you had about roots have changed as you write them in your poetry.
When I was in my teens, I experienced the deaths of several family members in a row. It was so strange how they were just gone in a single moment, without a trace. At that time I had the realization that a person is not a tree. It was afraid of experience rather than abstract concepts, so after that I grew up rummaging through roots, real and symbolic. This had a big effect on my way of life. The fact that I had no roots made me feel anxious and afraid, and I had to invent a way to survive as a rootless being. I was anxiety-inducing to be rootless, but wasn’t I also that much freer? If I could have, not the gravity of rootedness, but the zero-gravity of rootlessness, couldn’t I soar upward weightlessly? If I could just love that momentary enchantment, then I wouldn’t lose my courage. These are the kinds of ideas I made for myself. The foot is an ambivalent body part. Our feet hold us up on the ground, but they can also move freely as they desire, and jump up into the air. When I write poetry, my feet leave the ground and take on the freedom of weightlessness. In reality, I struggled with the thought that my feet were often too far off the ground. In that sense, the foot and ankle are a place of both love and hate for me.
I feel no matter how beautiful the scene out a window is, people have a hard time looking at the same scenery constantly. Maybe it’s because people have feet and not roots. Isn’t that the reason we have feet? To go set foot in some unfamiliar place? I ask myself these questions often. Courage is very important to me. Like just going and sitting down at a new, blank page with nothing on it. From my perspective, that’s when I like poetry, and life as well.
You’ve often referred to yourself as a ‘momentist.’ As an attitude toward life, the saying ‘seize the moment’ has given me a lot of courage too. A ‘moment’ is a point at which there is a break in time, a point at which there is a cliff, a breaking-free. Your attitude towards life as a momentist appears in your poems in a variety of ways. In “Voices”, from The History of an Impossible Page, your fourth collection, the images of stone, light, wall, and so on feel to me like desperate voices created by a moment of time. I can feel a force that isn’t trapped or stuck but breaking free and expanding. Tell me more about writing poetry as a momentist.
Since it was the one who defined myself that way, it feels like I do always have to be a momentist. I actually do think in very short units of time. Maybe a month at the longest. It’s hard to think in longer time spans because it feels so heavy. Being a momentist is a kind of incantation for me. A moment is exactly the point at which a unit of time comes into existence, so it must be useless, devoid of any purpose. What I like is that zero point, which might be a kind of liberation. A moment is something so intense and yet empty, so it is enchanting.
That’s why I try to live my life as a momentist. Poetry is also structured by moments of sensation. A moment can be expressed as a single second. Within that second, like a line to its core, is the first, the least. The point at which the single second is spoken. That which doesn’t go away even when everything else does. In other words, the original form. I think that, within the moment of a second, there is a minimum—a least—that brings the moment forth. I like to discover that place. I think that’s why people sometimes say I write in a very unfeeling way. I’m starting to realize these moments I meet are eternity. I think about the realization that the very largest thing can be held within the very smallest, so a moment feels like a vortex, and a first feels like the eye of a typhoon.

When I read the poem “Shadows,” I thought about the things that produce a deep sense of solitude. Solitary moments when we are left by ourselves. Whenever I read your poems, it feels like I often stop on the words shadow, air, and solitude. They are present yet absent, opened but closed. The words “sinews of shadows” make us think of the shadow like a body. And we discover a contradictory aspect—empty yet full—to the motif of empty air in lines like “stairs made from the solitude of the air” (“Apple Store”). You’ve also written several linked poems about solitude, but with aspects other than loneliness or silence. What sort of thoughts or stories have you had while writing about shadows, air, and solitude?
I’ve been consistently interested in air, in the sense of a kind of visual emptiness. Air as the space that brings stairs and roofs into existence. I want to keep discovering that empty air. It’s because I want to have more experiences with it as something concrete, rather than abstract. Shadows and solitude share this same context. They’ve both gradually come to have a sort of corporeality, rather than remaining at the emotional level.
Because the concrete is not conceptual, but something with an actual form, I kept finding myself moving toward, not thinking those things, but becoming them. Becoming is a kind of experience, so although I was moving toward a different space, it was also my own. It was a shared space that was created. And then I just ended up staying there for much longer. Even after everyone else had gone back, I remained, and I returned again afterwards as well. I found myself hesitating in that space where I remained. It was actually a bit scary to learn the solitude of the final remaining place. Still, I think the place of poetry is that last remaining person, the one who returns to that empty place even after everyone else has gone back a long time ago. If you focus on the sinews of solitude, I think you won’t lose the dancing body.
In the afterword to your fifth collection, Let Love Be Born, critic Park Sangsoo mentions that we “must give some time to considering child-like naivete as one force that has led [your poetry] to this point.” I agree that naivete is important to your poetry. I think it arises from an attitude of refusing to let life make you solemn, of struggling to maintain a condition of not knowing, of being unfamiliar. And that’s actually why it’s so hard to maintain naivete. Why are your poems oriented toward naivete, and how do you break through at times when you can’t hold on to being naive?
I’ve spent lots of time with the phrase “no birth, no death” (불생불멸). In this space of neither emergence nor dissipation, it’s written that this is the same as naivete or innocence. Maybe that’s the foundation. Maybe that’s why I love naivete, why I’m always trying to find it within and without. Naivete is a space without distinctions, and the deepest of places. It’s not looking on, but diving in. It’s a space everyone experiences, so its time is the present. With weight, we can’t dive in or experience, and distinctions form. The space of altruism narrows, and the space of selfishness expands. To lose naivete is to lose the foundation, but the foundation never goes away, so it can’t be lost. I’m inclined to believe naivete is the foundation beneath every place.
If I’m not naive when I write, then I can’t awaken poetry or life, so when I’m not naive, I just walk a lot. After a while everything disappears, and all that’s left within me is a small, teary-eyed child. Things get simpler once I’ve met that inner child again. When things get simpler, I end up going to places I’ve never been before. If I change my outlook, then the world and my thoughts about it change too. I like that unfamiliar curiosity. I never have to go as far as I’d expect to get to all sorts of places I’ve never been.
Of all your books of poetry, Let Love Be Born is the collection that reveals the most emotion. I’ve always thought your poetry focuses more on the discovery of sensory detail than on psychological aspects, but it occurs to me that you’ve gone through a period when your emotions couldn’t help but come out. Your poetry inevitably deals with the subject of death. You’ve said that experiencing deaths close to you, both personally and socially, has left many graves within your body. What were the images of death you perceived close by as you wrote Let Love Be Born? And how did you use poetry to get through that time?
You know how you sometimes search yourself on the internet? Once by coincidence, I came across a blog where a reader had written, “Yi Won feels a sense of vitality in death.” It felt like a revelation. I mean, it meant that I was centered on death. If I think back on it, my life did always have death at its center at that time. I mentioned that I became a material momentist after losing several family members in my teens. And even as an adult, the deaths of people close to me, as well as those in society, shook me terribly. In a sense, I was experiencing death and changing it, and I felt a close relationship to death. Sometimes I wonder if it’s my responsibility not to let death be death, and to live death instead. As more graves are lain within my body, and looking after them becomes part of my life, I realize that when I write poetry, the pencil of death and the dead themselves have written many sentences. And when that feeling comes over me, I have the ethical thought that perhaps I haven’t failed to fulfill my responsibilities.
The communal tragedy of the Sewol ferry disaster1) had a big effect on my poetry. Let Love Be Born is composed of the poems I wrote during that time. I never liked to write poems that prioritize the human perspective, so I rarely allow the intrusion of the first person, but this time was like a whirlwind that swept over without a moment to think about method. I felt myself entering and speaking in the first person before I knew what was happening. It was also a time of hopelessness about what poetry could actually do. I leaned a lot on the poetry of my fellow poets, who had taught me, guided me, and written alongside me, and I came to believe in the possibility of raising our voices in chorus. In that collection there’s the line, “When I press my two hands together, how is it that you come to cry?” I had a realization that this is what prayer is. If I press my two hands together, a space forms for you to cry. If there are many innocent hands, a desperate light rises from the community. I came to believe in the possibilities of innocent hands even amid pain and suffering.
You write in your prose collection The Smallest Discovery that you’d like to write the poetry of a machine–mudang (shaman): “If it’s conflicting, then it’s conflicting. If it’s too different, then it’s too different. If it clashes, then it clashes. This is the type of poetry I wanted to write. I felt this desire to create a place for the machine–mudang through poetry.” When I read those lines, I thought it suited you very well. The machine–mudang seems to touch on your attitude of carrying through all the points of possible contradiction. Are you still interested in writing machine–mudang poems?
It’s a point I’d like to reach as a poet and a phrase that I still hold in my heart. Maybe it’s because I’ve always been timid, but as the time I’ve lived accumulates, I find I’m struggling with more and more fears. I have to confess that I’ve grown a contemplative perspective, so I tend to wander and shy away from things and to be afraid and lose vitality. But to look without exaggeration, to be reinvigorated, is still the place I want to reach.
I’d also like to ask you about poetry translation. Your poems have been translated into many languages, including English, German, Japanese, Arabic, and Dutch. The language of poetry doesn’t really line up logically—it’s closer to illogic. I imagine that in the translation process you’ve felt the difficulty of making adjustments, as well as points of freedom in donning an unfamiliar language. What has it been like to have your poems translated?
I think that the process of translation is both extremely difficult and beautiful. After all, the language changes, but it’s the same living thing within. That experience is special to me too. I’ve worked on just a few poems up to an entire collection. I’ve usually communicated with the translators over email. Sometimes we’d send a few dozen emails, sometimes a few hundred. In order to find just the right word they examine everything down to the veins, looking into Korean culture and even into me personally. Almost like a surgeon operating on what’s inside my head. And the process becomes a mirror for me to look into my mind as well. 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World’s Lightest Motorcycle that came out in the United States actually won the LTI Korea Translation Award last year. It was translated by E. J. Koh and Marci Calabretta Cancio-Bello. Marci came to Seoul to receive the award and we got to spend some personal time together too. It was interesting because it felt like the kind of connection you have with an old friend.
A while ago at an international poetry festival, I took part in a translation workshop for my poems over several days. Several poets from different countries asked me all these questions in person and translated my poetry into their native languages. On the last day there was a reading in which we alternated, with me reading the Korean poetry first, followed by the translation. I remember finding it interesting that the translations could touch me with this vibrant, wriggling feeling even though I couldn’t speak the languages. I was so surprised when someone in the audience from another country came up to me at the end of the workshop and said, “Now I share a part of your spirit.” Searching for something in common in other languages feels like an impressive endeavor for the people of this Earth to engage in. A very impressive dance that crosses national borders.
When I read your recent poems “Small People Community” and “Friendly Gathering,” I thought about the moments when people meet each other. These poems left me with a feeling that they were at once carrying the possibility of community—even with just two people, even in silence, even if they don’t actually meet at all—as well as its impossibility. In the same vein, I was struck by the “world of Everyone” in the poem “Shared Kitchen.” The line “Until the feet leave those slippers, this is the shared kitchen,” gave me a physical experience of a new way of thinking about sharedness. Tell me more about your thoughts on meetings between people, and on community.
I don’t think there’s any more continuous, living way of learning than meeting. Meeting spreads outward in concentric circles from you and I, to us, to the country, to Earth. We ask the biggest questions and stroll across boundaries and try to make our bodies as small as possible. I think we’re in a time of many rapid, tumultuous changes, both in society and in the world. In times of tumult we’re very quick to judge and categorize for the sake of a new order. If society’s role is to create a superficial order, what can poetry do? I ask myself those kinds of questions often. Rather than looking for quick definitions, I think you have to try to very delicately approach the places where you can hear the big crashing sounds. I feel there’s something sinking away, something we must save, in acts of judgment and definition. Might poetry be in the direction of this saving? To do so, you must become even smaller and more delicate. This is my kind of self-inquiry and self-answer. When you become smaller, you approach things in more detail, and you can see what’s blatant too, so it might seem a bit coarse. But if you approach with a naive mind, in the direction of saving, then might that place be the possibility of community? Like a spark that we kindle together.

I’ve always felt your poetry was somewhat similar to painting. But while the more recent poems we’re discussing maintain that detailed accuracy of scene, they also feel cinematic in their progression, like the movement of a camera. Was there something that brought about this change?
I’m still a visualist who likes writing poems in descriptive form. If something feels cinematic about my recent poems, it’s probably because I’m trying out a somewhat different poetic language. Before, I structured poems in a painterly way, like a single canvas, but now I’m leaning toward structuring them as a scene. The painterly method offers a high level of tension, while a scene can rest within the flow of time.
Can poetry be made from tepidity? Can poetry be written with an unoppressive method? Can I become a tepid hand? Can I endure this anxiety? Nature is tepid, so is it anxious too? Do trees grow through the force of anxiety? There’s no drama to minimal construction. Every element is removed and only tepidity remains. That’s what makes it avant-garde. Tepidly/minimally—are these two in opposition? Are they a match? If language lets go of language, does the minimal emerge? Will language remove the unnecessary elements from abstraction all on its own? Then will the minimal naturally remain as the minimal? If you don’t let poetic sensations, poetic leaps, and poetic intention lead, then the prosaic inserts itself, but can this prosaicness maintain nature’s tension? Can it become the inevitability of coincidence? These are the questions I’m asking. Some days I call it impossible and some days I call it possible. My recent poems are a result of this rummaging. These days I want to lose. I don’t want to be steadfast.
In the poems “Biosphere” and “Rare Earth Equation,” we get a glimpse of your recent interests. Of course, we can also find extensions of your earlier poetic thought, in the sense of dismantling or overthrowing the idea of human superiority on Earth, in certain phrases: “of the mind [that] things would look a lot better if people shrank a bit, somehow or other,” “What’s superior is what’s vaporized,” “The grass grows all around when no one’s looking,” and so on. Still your view of the ecosphere itself seems to appear more prominently here. Does this touch on your recent interests?
I used to lean much more heavily into the human world, but now I’ve come to see the world that was there before as well, in a way that’s less stiff and has a more natural rhythm. I think it took a long time before I could see difference in one place. It’s one thing to take difference and coexistence apart and see them separately, but it’s another to see them together as one scene. It becomes easier to see disparate aspects, and easier to see difference. It’s easier to see how things are separate and together at once. Come to think of it, I guess there’s a natural shift from the poem “Unexpected Earth,” in which I was trying to discover an unexpected earth, to my curiosity about the equation in “Rare Earth Equation.” I’ll have to walk a bit further before I know, but I want to turn on my ecosphere like a little light. I want to record it. It’s still in process, but I feel like there’s no doubt that, whether physical or figurative, poetry and the Earth are on the side of small things.
While I listened to each of your answers, I strangely felt a fluttering urge to write some poems myself. I suppose your thoughts and energy for poetry must have rubbed off on me. I’d like to hear more, but unfortunately I think this will have to be my final question. What is the most daring thing you’d like to try today as part of your everyday life?
Poet Miok, after talking with you I also have an urge to write poetry, coming to me in the bright image of a rabbit. At first it was only a long pair of ears. When I take a walk, there’s a place where I turn around every day. I’d like to not turn around, and to go on walking aimlessly in that direction. What if it gets too dark? What if solitude closes in? What if I don’t have the energy to make it back? No, I’m not going to worry about any of that. I want to walk with the confident steps of a little soldier boy.
Translated by Seth Chandler
KOREAN WORKS MENTIONED:
• When They Ruled the Earth (Moonji, 1996)
『그들이 지구를 지배했을 때』 (문학과지성사, 1996)
• A Thousand Moons Rising Over the River of Yahoo! (Moonji, 2001)
『야후!의 강물에 천 개의 달이 뜬다』 (문학과지성사, 2001)
• The World’s Lightest Motorcycle (tr. E. J. Koh, Marci Calabretta Cancio-Bello, Zephyr Press, 2021)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오토바이』 (문학과지성사, 2007)
• “Voices,” “Shadows,” The History of an Impossible Page (Moonji, 2012)
「그림자들」, 「목소리들」, 『불가능한 종이의 역사』 (문학과지성사, 2012)
• “Apple Store,” Let Love Be Born (Moonji, 2017)
「애플 스토어」, 『사랑은 탄생하라』 (문학과지성사, 2017)
• “Machine–Mudang (1),” The Smallest Discovery (Minumsa, 2017)
「기계-무당 (1)」, 『최소의 발견』, (민음사, 2017)
• “Friendly Gathering,” (Siindongne, Aug. 2019)
「친목 모임」 (시인동네 2019년 8월호, 2019)
• “Shared Kitchen” (Webzine Gongsisa, June. 2020)
「공용 키친」 (웹진 공정한시인의사회 2020년 6월호)
• “Small People Community,” (Literature and Society vol. 134, 2021)
「작은 사람 공동체」, (문학과사회 2021년 여름호, 2021)
• “Biosphere,” “Rare Earth Equation,” (Webzine View vol. 57, 2022)
「생물권」, 「희귀한 지구 방정식」, (웹진 비유 2022년 9월호, 2022)
1) The sinking of the MV Sewol, in which 304 peopledied or went missing, most of them Korean high school students on their way toJeju Island for a class field trip.—Ed.
뛰어들기의 시간: 이원 시인과의 인터뷰
안미옥
평소 무생물을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네킹이나 로봇뿐만 아니라, 낙타 인형이나 오토바이를 탄 여자아이 피규어, 코끝이 부서진 피노키오 같은 것을요. 낙타의 눈을 닦아주거나 피노키오가 기댈 벽을 찾아주며 무생물을 돌보고, 그 시간을 통해 살아 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신다고요. 요즘 작가님께서 가장 가까이 돌보고 만나는 무생물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 대상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내적 친밀감을 공유한 안미옥 시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 기쁘고 설레요. 사적 지점과 문학적 지점이 교차하는 곳에서 어떤 대화가 펼쳐질까 궁금해요. 저로서는 질문 하나하나가 미옥 시인이 선물해 주는 거울 같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수 없는 여러 각도를 보여줄 테니까요. 그 안에서 알지 못했던 제 얼굴도, 찾아가고 싶었던 얼굴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개인적으로도 시적으로도 질문이 많고 그런 만큼 자주 멈추기도 하는 나날이어서 이 대화가 참 귀하게 느껴져요.
무생물 좋아해요. 무생물과 마주하는 순간은 참 말끔해져요. 제 몸과 영혼이 고요해지고 환해져요. 미옥 시인이 소개하는 저 존재들과 여전히 함께하면서 서로 돌보고 있고요. 무생물에 대한 매혹은 여전한데 전보다 곁으로 덜 데려와요. 더 조심스러워졌다고나 할까요. 최근에 가까이 있는 존재는 새예요. 아마포로 만들어진 무채색 계열인데요. 눈도 부리도 날개도 없는, 아니 어쩌면 눈과 부리, 다리와 날개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새예요. 구체적 형상이 없어서 제게는 더 새 같아요. 어둠 속에서도 새예요. 밝아와도 새예요. 최소한만 갖고 있으면 무엇을 함부로 덧입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아마포 새는 나를 가라앉혀 줘요.
무생물에 대한 매혹이 작가님의 시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첫 시집 『그들이 지구를 지배했을 때』에 등장하는 마네킹이나 비닐봉지, 밥솥, 플러그, PC에서부터 이후 오토바이, TV, 운동화, 양변기 등에서 시적인 상상력이 발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각과 사유를 던져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말하는 ‘시적’ 대상으로 잘 다뤄지지 않던 것이 자연스럽게 시가 되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시집 『야후!의 강물에 천 개의 달이 뜬다』에서는 무생물을 대상으로만 쓰지 않고 화자가 사이보그로서 발화하기도 합니다. 사이보그의 목소리엔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 필연성이 엿보입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시적’인 것은 무엇이고, 요즘 자주 떠올리시는 시적 대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끝내 모를 것을 사랑하면 아름다움이 될 것인가”라는 구절을 쓴 적이 있는데, 시 스스로가 그 능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애쓴다기보다는 시라는 알지 못하는 영역이 그리하는 것이지요. 알 수 없는 그 감각에 나도 참여하게 될 때 시적이라고 느끼고요. 그 모름을 편애하지요. 저도 모르는 문장을 썼는데, 그 문장에서 이 세상과 닿아 있음을, 이 세상에 제가 온 이유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의 신비가 제가 계속 시를 쓰는 이유일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이 시적이라고 느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매혹을 따라가는 쪽이기는 한데요. 예전에는 집중하는 대상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점점 장면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흔하게 스쳐 지나갈 법한 일상의 장면인데, 그 안의 우연과 필연을 미니멀의 방식으로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지속되는 방향성이라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것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변화가 두드러지는 지점에 관심이 많고요. 다른 것이 같이 있는 충돌, 모순이라고 할 만한 것을 좋아해요. 모순을 경계가 아니라 공존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물론 공존은 심리적 지점보다는 카메라의 시선처럼 기하학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싶어 하고요.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작가님의 시에는 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집에 언급된 ‘뿌리’는 이후 ‘발목’과 ‘발’의 이미지로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뿌리’에 대해 쓰게 된 이유가 궁금하고, 시로 쓰면서 뿌리에 대한 생각이나 감각이 변화한 지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10대 때 연이어 가족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 이상했어요. 인간은 나무가 아니구나, 그때 알았어요. 관념이 아닌 경험은 무서운 것이어서, 그때 이후 실제적 그리고 상징적 뿌리를 뒤척이며 자랐어요. 이 지점이 제 삶의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뿌리가 없다는 사실이 불안했고 무서웠고 그런 만큼 나는 뿌리 없는 존재의 생존 방식을 발명해야 했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불안하지만 그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아닌가? 뿌리 있음의 중력이 아니라 뿌리 없음의 무중력을 갖고 있다면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순간의 황홀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용기가 없어지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만들어 갔어요. 발은 지탱의 수단이지만 마음껏 움직일 수도, 힘껏 뛰어오를 수도 있는 양가적 부위잖아요. 시를 쓸 때는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서 무중력의 자유를 갖는데요. 현실에서는 땅에서 발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주 시달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발목이나 발은 제게 애증의 장소이기도 해요.
아무리 멋진 풍경을 담은 창이어도, 같은 풍경을 계속 보는 것을 인간은 어려워한다는 것을 느껴요. 인간은 뿌리 대신 발이 달렸기 때문이 아닐까, 발은 낯선 곳으로 다시 내디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주 자문해요. 제게 중요한 것은 용기예요. 아무것도 안 써진 새 종이로 옮겨 앉기부터 하는 것처럼요. 제 관점에서는 시도 삶도 그럴 때 마음에 들어요.
작가님은 스스로 ‘순간주의자’라고 명명하셨고, 질문도 자주 받으셨던 것으로 압니다.(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질문 같아요) 삶의 태도로서 ‘순간’을 붙잡고 산다는 말이 제게도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순간’은 시간의 단절이 일어나는 지점이고, 그래서 절벽이고, 벗어남의 지점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순간주의자로서 작가님 삶의 태도는 시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네 번째 시집 『불가능한 종이의 역사』의 「목소리들」이라는 시에서는 돌, 빛, 벽 등의 이미지가 순간의 시간이 만들어낸 절박한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갇혀 있거나 멈춰 있지 않고, 벗어나면서 확장되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순간주의자로서 시를 쓴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규정했으니 내내 순간주의자여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간 단위를 매우 짧게 생각해요. 길어야 한 달 정도예요. 길게 생각하면 무거워서 힘들어요. 순간주의자는 제게 주술 같은 거예요. 순간은 시간의 단절이 일어나는 바로 그 지점이니까 어떤 목적도 제거되는 무용(無用)이잖아요. 저는 해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로의 지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순간은 가장 격렬한 동시에 아무것도 없어 황홀해요.
그래서 삶을 순간주의자로 살아요. 시도 순간의 감각으로 구조화해요. 순간은 나타나는 1초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1초 안에는 최소라는 최초가 심지처럼 들어 있지요. 1초가 발화된 지점, 다 없어져도 안 없어지는, 즉 원형 말이죠. 1초의 순간 안에는 순간을 솟아오르게 하는 최소가 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곳을 발견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비정한 방식으로 쓴다는 얘기도 듣는 것 같아요. 점점 내가 만난 순간이 영원이구나 생각돼요. 가장 작은 것 속에 가장 큰 것이 들어 있구나, 그래서 순간은 소용돌이 같고, 최초는 태풍의 눈처럼 느껴지는구나, 생각하곤 해요.
「그림자들」을 읽다 보면 깊은 고독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홀로 남겨지는 고독한 순간의 시간을요. 저는 작가님의 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시어 중 그림자, 허공, 고독이라는 단어에 자주 머물게 되는 것 같아요. 존재하지만 동시에 부재하고, 열려 있지만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림자들의 힘줄”을 떠올리며 그림자를 몸처럼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계단은 허공의 고독으로 만들어진 것”(「애플 스토어」)이라는 구절에서처럼 여러 시에서 변주되는 ‘허공’이라는 시어에서 텅 비어 있으면서 동시에 꽉 차 있는 모순된 지점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고독에 대해서는 연작시를 쓰신 적도 있는데요, 외로움이나 고요와는 다른 지점의 고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자, 허공, 고독을 쓰면서 갖게 된 생각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시각적으로 비어 있음을 뜻하는 ‘허공’에 지속적인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계단과 옥상을 존재하게 하는 공간을 허공이 갖고 있어요. 저는 허공을 계속 발견하고 싶어요. 허공은 ‘추상’이 아니라 ‘구상’이라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그림자나 고독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정서적 층위보다는 점점 육체성을 갖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구상은 관념이 아니니까 실체가 있는 것이니까 생각하기(생각하니?) 아니고, 자꾸자꾸 그것들이 되어보는 자리로 가게 되었어요. 되어보기는 경험이니까, 그 자리는 내 자리이기도 하더라고요. 공동의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제일 나중까지 남아 있게 되었어요. 모두가 돌아가고 난 뒤에도 남아 있고 또다시 돌아와 보기도 하고요. 남겨지는 자리에서 자주 서성이게 되었어요. 최종적으로 남겨지는 자리, 그 고독을 알게 되어서 좀 무섭기도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시의 자리는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람, 모두 돌아가고 난 뒤 한참 뒤에도 텅 빈 곳으로 다시 돌아와 보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고독의 힘줄에 집중한다면 무용수의 육체를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시집 『사랑은 탄생하라』의 해설에서 박상수 평론가는 작가님의 시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다른 힘으로 ‘아이의 천진함’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도 작가님의 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점 중 하나가 ‘천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삶에 비장해지지 않으려는 태도이고, 모르는 상태, 낯선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애씀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천진함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에서 천진함을 지향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천진하지 못한 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 돌파해 나가시나요?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는 글자에 오래 머무른 시간이 있어요. 나지도 죽지도 않는 자리, 거기에 천진과 같은 뜻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거기가 바탕은 아닐까, 그래서 나는 천진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자꾸만 그걸 찾는 걸까, 물어보고는 해요. 천진은 구분이 없는 자리이고, 가장 깊숙한 곳이잖아요. 바라보기 아니고 뛰어들기잖아요. 다 겪는 자리니까 현재성의 시간이잖아요. 무거우면 뛰어들 수 없고, 겪을 수 없고, 구분이 생기지요. 이타의 자리는 좁아지고 이기의 자리가 커지지요. 천진을 잃어버린다면 바탕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바탕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니까 잃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곳에는 천진이 바탕이라는 것을 믿는 쪽이에요.
쓰는 내가 천진하지 않다면 시를, 삶을 깨울 수 없어서, 천진하지 않을 때는 많이 걸어요. 그러다 보면 다 사라지고 내 안에서 글썽이는 어린아이만 남아요. 그 어린아이와 만나면 다시 간단해져요. 간단해지면 한 번도 안 가본 장소에 가요. 시야를 바꾸면 세계도, 세계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요. 그 낯선 호기심이 좋아요. 멀리 떠나지 않아도 내가 안 가본 장소는 생각보다 참 많더라고요.
『사랑은 탄생하라』는 작가님의 시집 중 감정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시집입니다. 시를 쓸 땐 심리적 지점보다는 감각과 발견의 지점에 집중하시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지나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의 시에서는 ‘죽음’에 대한 사유가 필연적으로 등장하지요. 개인적, 사회적으로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겪으며 몸 안에 무덤이 여럿 생겼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사랑은 탄생하라』를 쓰면서 가깝게 감각하게 된 ‘죽음’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또 시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그 시간을 통과해 오셨는지요?
가끔 자신의 이름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때가 있잖아요. 우연히 어떤 독자가 쓴 블로그에서 “이원은 죽음에 생동감을 느낀다”라는 표현을 봤어요.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내 중심이 죽음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생각해 보니 내 삶에는 늘 죽음이 중심에 있었어요. 10대 때 가족이 연달아 죽고 나서 물질적 순간주의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른이 되어서도 가까운 이들의 죽음, 사회적인 죽음이 저를 몹시 흔들었어요. 결국 나는 죽음을 겪고 죽음을 변화하고 있는 셈이고, 죽음에서 밀착을 느낀 것이지요. 때때로 죽음을 죽음으로 내버려두지 않고 죽음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내 책임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해요. 내 몸속에 무덤이 늘어나고 그 무덤을 돌보며 살아가니까 시를 쓰면 죽음의 연필이 쓰는 죽은 존재들이 쓰는 문장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문득 느낄 때 내가 책임을 저버리지는 않았구나 하는 윤리적 생각을 하기도 해요.
‘세월호 참사’라는 공동체의 비극이 제 시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어요. 그 시간에 쓴 시들이 『사랑은 탄생하라』라는 시집이지요. 인간적 관점이 우선하는 시를 쓰고 싶지 않았기에 1인칭의 개입을 거의 하지 않는데 이 시간은 방식을 생각할 틈도 없이, 휘몰아친 소용돌이였어요. 저절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1인칭으로 발화하게 되었어요. 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깊은 절망감을 느낀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선생님들, 선배들 동료들의 시에 많이 기대기도 하면서 합창의 가능성을 믿게도 되었어요. 저 시집에 “내 두 손을 맞대는데 어떻게 네가 와서 우는가”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기도는 그런 것이구나, 내가 두 손을 맞대면 네가 울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것이구나, 순진한 손이 많다면 공동체에 간절한 빛이 생기겠구나, 고통 속에서도 순진한 손의 가능성을 믿게 되었어요.
산문집 『최소의 발견』에서 ‘기계-무당’의 시를 써보고 싶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상반된 것이라면 상반된 것이다. 너무 다른 것이라면 너무 다른 것이다. 충돌이라면 충돌이다. 이런 시를 쓰고 싶었다. 시로 기계-무당의 자리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욕망을 가졌다.”라는 문장을 읽고 작가님과 무척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계-무당’은 모순이 될 수 있는 지점을 모두 가지고 가겠다는 작가님의 태도와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무당’의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한지요?
시인으로서 도달해 보고 싶은 지점이고, 지금도 여전히 심장으로 품고 있는 단어예요. 태생적으로 겁이 많아서인지 삶의 시간이 축적될수록 무서움이 더 생겨서 난처해하고 있어요. 관조적 시선이 나타나서 일정 부분 헤매고 있고, 웅크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생기를 놓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렇지만 과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겠다, 다시 신명을 깨우겠다, 여전히 제가 이르고 싶은 자리예요.
시 번역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작가님의 시는 그동안 영어, 독일어, 일본어, 아랍어, 네덜란드어 등으로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라는 언어는 논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논리에 가깝지요. 그래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조율의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낯선 언어의 옷을 입고 자유로워지는 지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시가 번역되는 경험이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번역의 과정은 지난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어가 바뀌는데 안은 같은 생물이 들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경험은 제게도 특별해요. 몇 편에서 한 권의 시집에 이르기까지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대부분은 메일을 통해 소통했어요. 수십 통에서 수백 통의 메일을 주고받은 적도 있어요. 번역가들은 정확한 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나 개인적 접근까지, 마치 혈관을 살펴보는 것처럼 작업해요. 번역가는 내 머릿속에 들어온 집도의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 저 또한 제 머릿속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게도 되고요. 지난해에는 미국에서 나온 제 영어 시집이 번역원에서 주는 한국문학 번역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고은지(E.J Koh)와 마시 칸시오 벨로(Marci Calabretta Cancio-Bello) 두 분이 번역했어요. 마시는 수상을 하러 서울까지 와서 개인적으로도 따로 만났는데요. 오랜 친구처럼 교감이 되어 참 신기했어요.
예전에 한 국제 시 축제에서 며칠 동안 진행된 제 시의 번역 워크숍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현장에서 여러 나라 시인이 제게 많은 질문을 하며 그들의 모국어로 시를 번역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제가 먼저 한국어로 시를 읽고 번역한 시를 교차 낭독했어요. 알지 못하는 언어인데 제게도 생생한 느낌으로 꿈틀대며 와닿는 것이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워크숍이 끝나고 외국 관객이 제게 다가와 “당신 정신의 어떤 부분을 나 자신도 공유하고 있다”고 얘기해 줄 때 참 놀라웠어요. 다른 언어로 공통의 것을 찾는 과정은 지구인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멋진 일 같아요. 국경을 넘어가는, 아주 멋진 춤이에요.
근작 시 「작은 사람 공동체」, 「친목 모임」을 읽으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순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둘만으로도, 침묵만으로도, 만나지 못해도 공동체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불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공용 키친」에선 ‘에브리원의 세계’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슬리퍼를 빠져나오기 전까지가 공용 키친인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공용’에 대한 새로운 사유도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공동체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더 듣고 싶습니다.
만남만큼 계속되는, 살아 있는 공부는 없는 것 같아요. 만남은 너와 나, 우리, 나라, 지구, 동심원처럼 번져요. 제일 크게도 질문해 보고 경계도 성큼성큼 넘어가 보고 몸을 제일 작게도 만들어보기도 해요. 사회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고, 격변기 같은 생각도 들어요. 격변기에는 새로운 질서를 위해 빠르게 재단하거나 범주화하게 되는데요. 표면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라면 시의 언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빠른 규정보다는 파열음이 나는 곳에 한결 섬세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단이나 규정 속에 함몰되는 것이, 살려야 하는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살리는 방향에 시가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더 작고 섬세해져야 한다고 자문자답해요. 작아지면 자세히 다가가니까, 적나라한 것까지도 보니까, 자칫 모질다고 여겨질 수 있지요. 그러나 다가가는 마음이 천진하다면, 살리는 방향이라면 그곳이 공동의 가능성이 아닐까요? 함께 지켜내는 불씨처럼요.
작가님의 시가 대체로 회화와 유사하게 느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근작 시에선 장면의 정확함은 여전히 가지고 가면서도 진행 방식이 카메라 무빙을 연상시켜 영화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변화의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전히 시각주의자이고, 묘사의 형태로 시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영화적으로 느껴진다면 조금 다른 시의 언어를 시도해 보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지금까지 한 폭의 그림 같은 회화의 방식으로 구조화했다면, 지금은 한 장면으로 구조화하는 편이에요. 회화적 방식은 긴장감이 높은 반면, 장면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놓이지요.
미지근함으로 시를 만들 수 있을까. 억압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가 써질 수 있을까. 미지근한 손이 나는 될 수 있을까. 이 불안을 견딜 수 있을까. 자연은 미지근한데 그렇다면 자연도 불안할까. 나무는 불안의 힘으로 자랄까. 미니멀한 건축에는 드라마가 없는데, 모든 요소가 제거되고 미지근함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전위적인데, 미지근하게/미니멀하게, 이 둘은 대항일까. 짝패일까. 언어가 언어를 놓아주면 최소가 나타날까. 추상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언어는 스스로 제거할까. 그러면 최소는 최소로 자연스럽게 놓이게 될까. 시적인 감각, 비약, 의도를 앞세우지 않으면 산문성이 개입되는데, 이 산문성은 자연의 긴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연의 필연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날은 불가능이라고 하고 어떤 날은 가능이라고 해보게 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런 뒤척임의 결과가 최근에 쓴 시이고요. 저는 지금은 지고 싶어요. 완강하지 않고 싶어요.
「생물권」과 「희귀한 지구 방정식」에선 최근의 관심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크기가 줄어들면 훨씬 보기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쪽”, “우세한 것은 휘발되는 것”, “풀들은 사방에서 모를 때 자란다”는 문장은 지구에서 인간이 우세하게 여겨지는 방식을 해체하거나 전복시킨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시적 사유와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되지만요. 생물권 자체에 대한 관점이 좀 더 전면에 나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의 관심사로 가닿는 지점이 있으신가요?
그동안 인간이 만든 세계에 기울어져 있었다면 원래 있던 세계까지 함께 보게 되었어요. 경직은 줄어들고 자연의 리듬으로요. 다름을 한 곳에서 보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 것 같아요. 다름과 공존을 각각 떼어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장면으로 보는 것은 참 다른 감각이에요. 이질적인 것도 더 잘 보이고 다른 것도 더 잘 보이고요. 어떻게 따로 또 같이 있는지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 “뜻밖의 지구”를 발견해 보던 시는 “희귀한 지구 방정식”을 알고 싶다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것 같아요. 좀 더 걸어봐야 알겠지만 제 방식의 생물권을 작은 등불로 켜보고 싶어요. 기록해 보고 싶어요. 과정에 있지만 물리적이든 비유적이든 시도 지구도 작은 존재들 편인 것은 틀림없거든요.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상하게도 시를 쓰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렁였어요. 아무래도 작가님의 시에 대한 사유와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그런가 봐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오늘, 일상에서 최대치로 용감하게 무엇을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미옥 시인과 대화하다 보니 제게도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환한 토끼 형상처럼 생겨나요. 처음에는 길쭉한 귀만 있었는데요. 걷다가 매일 되돌아오는 지점이 있는데요. 되돌아오지 않고 그 방향으로 무작정 더 걸어가 보고 싶어요. 너무 어두워지면 어떡하나, 더 고독해지면 어떡하나, 돌아올 동력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접어두고요. 꼬마 병정의 당찬 걸음걸이가 마음에 쏙 들 것 같거든요.